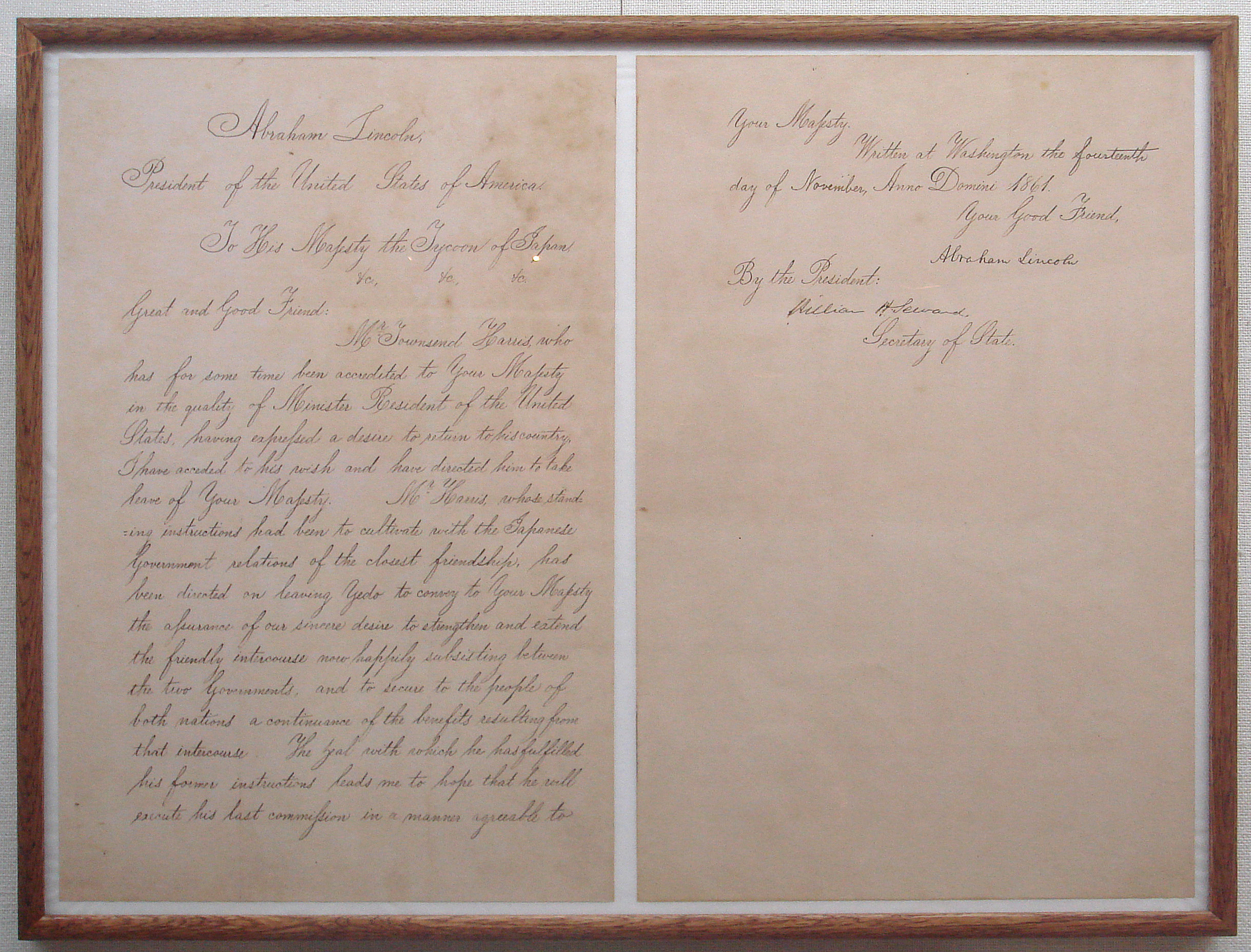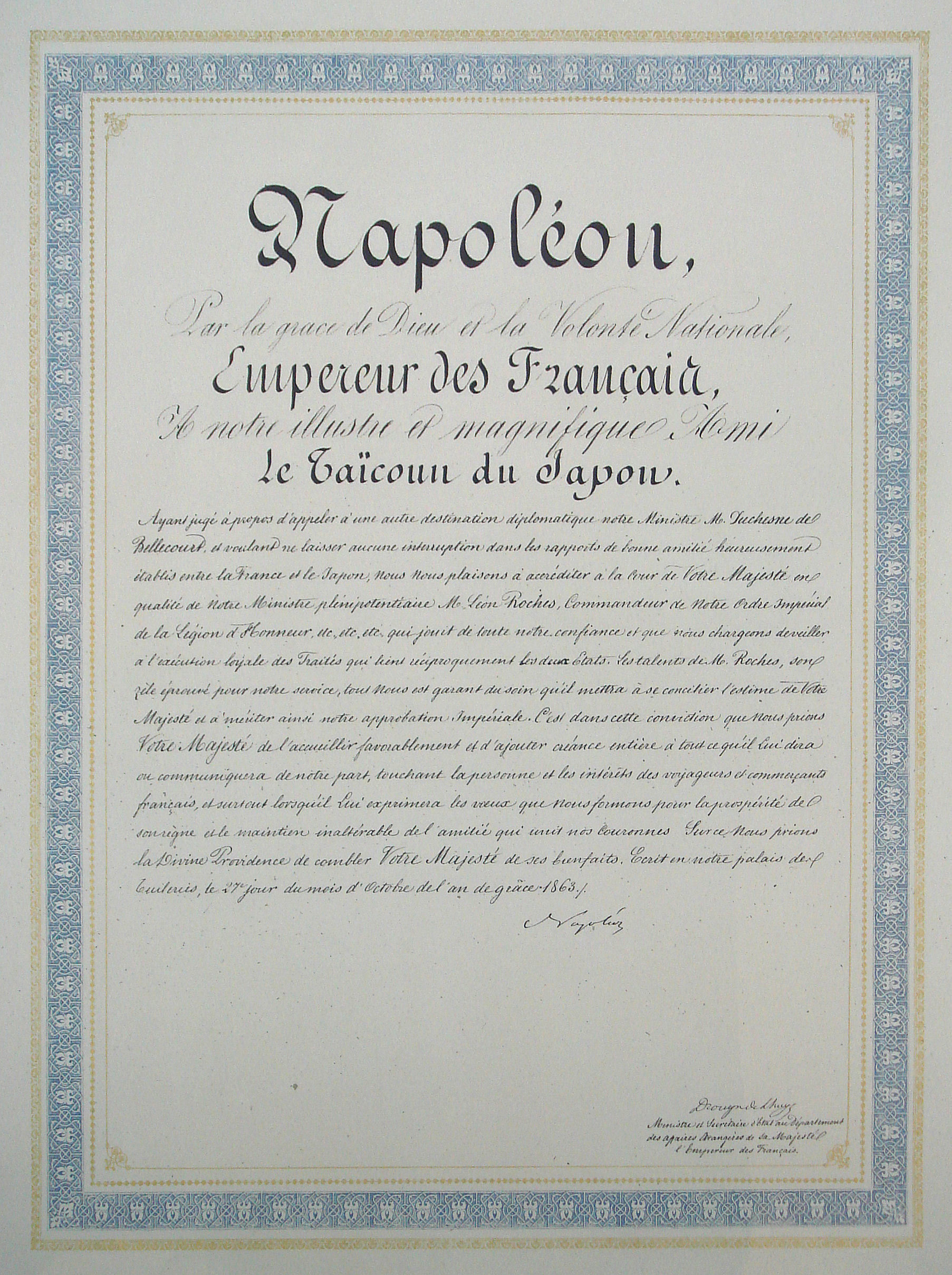도쿠가와 이에모치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도쿠가와 이에모치는 1846년 기슈 번의 번주 도쿠가와 나리유키의 차남으로 태어나, 1858년 14대 쇼군에 취임하여 도쿠가와 이에모치로 개명했다. 그는 13세의 어린 나이에 쇼군이 되었으며, 쇼군 후견인인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권력 제한을 받았다. 1860년, 공무합체론에 따라 고메이 천황의 여동생 가즈노미야 지카코 내친왕과 정략결혼했으며, 부부 사이는 원만했다. 1863년에는 229년 만에 교토로 상경하여 조슈 정벌을 명받았으며, 1866년 제2차 조슈 정벌 중 오사카 성에서 각기병으로 사망했다. 그의 사후에는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15대 쇼군이 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막말 기슈번 사람 - 무쓰 무네미쓰
무쓰 무네미쓰는 막말부터 메이지 시대에 걸쳐 활약한 일본의 정치가이자 외교관으로, 불평등 조약 개정 및 청일 전쟁 승리를 이끌며 일본 근대화와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했으나 삼국 간섭이라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 - 막말 기슈번 사람 - 도쿠가와 모치쓰구
도쿠가와 모치쓰구는 사이조번 번주의 아들로 태어나 기슈번 번주를 거쳐 막부 말기에 쇼군을 보좌하고 신정부에 협력했으며, 메이지 시대에는 와카야마 번지사를 지내고 귀족원 의원을 역임하다 사망했다. - 기슈번주 - 아사노 나가아키라
아사노 나가아키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히데타다를 섬긴 에도 시대의 다이묘로, 형의 사망 후 기이 기슈번을 상속받고 오사카 전투에서 공을 세워 아키 히로시마번의 번주가 되었다. - 기슈번주 - 아사노 요시나가 (아즈치모모야마 시대)
아사노 요시나가는 아즈치모모야마 시대의 무장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측근 아사노 나가마사의 아들이며 임진왜란, 세키가하라 전투 등에 참전했고, 세키가하라 전투 후 와카야마 번주가 되었으며 도요토미 가문 몰락 후 암살설이 돌기도 했다. - 기슈 도쿠가와가 - 마쓰다이라 요리즈미
마쓰다이라 요리즈미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손자이자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삼촌으로, 이요 사이조 3만 석을 받아 상근 교대를 하지 않는 정부 다이묘가 되었으며, 그의 사후 가독은 아들 도쿠가와 요리치가 계승하였다. - 기슈 도쿠가와가 - 기슈번
기슈번은 세키가하라 전투 후 아사노씨의 영지였다가 도쿠가와 요리노부가 상속받아 기이 도쿠가와 가문이 다스리게 되었고, 쇼군을 배출하며 막부와 관계를 유지했으나 재정난을 겪었으며, 판적봉환 후 와카야마 번으로 개칭, 폐번치현으로 와카야마현이 되었다.
2. 일생
에도 막부의 제14대 쇼군. 고카 3년(1846년) 기슈번주 도쿠가와 나리유키의 차남으로 에도의 기슈 번저에서 태어났다.[16] 아명은 기쿠치요(菊千代)였으며, 어릴 때 숙부이자 제12대 기슈 번주 도쿠가와 나리카쓰의 양자가 되어 4세에 번주 자리를 계승하고 이름을 요시토미(慶福)로 고쳤다.
병약했던 제1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사다의 후계자 문제에서 도쿠가와 요시노부와의 경쟁 끝에 안세이 5년(1858년), 13세의 나이로 제14대 쇼군에 취임하며 이름을 이에모치(家茂)로 개명하였다.[18] 쇼군 이에사다와의 혈연적 가까움이 쇼군 계승에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어린 나이로 인해 이이 나오스케, 다야스 요시요리,[20][7] 도쿠가와 요시노부[21][8] 등이 쇼군후견직 등을 맡아 실권은 제한되었다.[18]
분큐 2년(1862년), 공무합체 정책의 일환으로 고메이 천황의 여동생 가즈노미야와 결혼하였다. 비록 정략결혼이었으나 부부 사이는 원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듬해인 분큐 3년(1863년)에는 도쿠가와 이에미쓰 이후 229년 만에 쇼군으로서 교토로 상경하여 천황에게 양이를 약속하는 등[2] 막부의 권위 회복을 시도했으나, 존왕양이 세력의 반발과 정치적 제약에 부딪혔다.
게이오 2년(1866년), 제2차 조슈 정벌을 위해 오사카성에 머무르던 중 병으로 쓰러져 7월 20일에 사망하였다. 사인은 각기병으로 인한 심부전이었으며,[10] 향년 21세(만 20세)였다. 임종 직전 다야스 가메노스케(훗날 도쿠가와 이에사토)를 후계자로 지명했으나, 어린 나이와 시국의 불안정함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고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제15대 쇼군으로 취임하였다.[10] 사후 정1위 태정대신에 추증되었다.
2. 1. 어린 시절과 가독 상속
고카 3년(1846년) 윤 5월 24일, 에도의 기슈번 번저에서 제11대 기슈 번주 도쿠가와 나리유키의 차남으로 태어났다.[16] 그의 어머니는 가신 마쓰다이라 스스무(松平倏)의 딸 조시(実成院)였다. 손윗형이 있었으나 분세이 12년(1830년)에 사산되었다.[17] 아명은 '''기쿠치요'''(菊千代)였다.1847년, 한 살 때 숙부이자 제12대 번주인 도쿠가와 나리카쓰의 양자가 되었다. 가에이 2년(1849년), 숙부 나리카쓰가 사망하자 그의 양자로서 4세의 어린 나이에 가독을 이어받아 제13대 기슈 번주가 되었다.
가에이 4년(1851년)에는 원복을 치르고, 당시 제12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요시에게 이름 한 자 '요시'(慶)를 받아 '''요시토미'''(慶福)로 개명하였다. 동시에 히타치노스케(常陸介) 관직에 임명되고 종3위 관위를 받았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가독 계승 초기에는 은거해 있던 전 번주 도쿠가와 하루토미의 보좌를 받았다. 그러나 하루토미가 사망한 후에는 도쿠가와 이에요시의 측실을 누이동생으로 둔 부가로(附家老) 미즈노 다다나카가 실권을 장악했고, 다테 지히로(무쓰 무네미쓰의 아버지)를 비롯한 하루토미 측근의 번정 개혁파를 탄압하였다.[18][5]
요시토미의 기슈 번주로서의 치세는 9년 2개월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계속 에도에 머물렀기 때문에 에도 참부도 기슈(와카야마)로 귀국한 적도 없었다.[19][6]
2. 2. 쇼군 취임과 권력 제한
병약했던 제1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사다에게는 후계자가 없었기에, 히토쓰바시파(一橋派)가 내세운 도쿠가와 요시노부와 난키파(南紀派)가 지지한 요시토미(이에모치의 아명) 사이에 차기 쇼군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벌어졌다. 안세이 5년(1858년), 이 정치적 항쟁에서 요시토미를 지지하는 세력이 승리하였다.[18] 이에사다는 죽기 직전, 다이로(大老) 이이 나오스케에게 요시토미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그가 성장할 때까지 정무를 보좌하며, 모든 정치 문제는 이에모치의 양어머니인 덴쇼인과 상의하라는 유언을 남겼다.이에사다가 사망하자 요시토미는 13세의 어린 나이로 제14대 쇼군에 취임하였다.[18] 쇼군 취임과 함께 이름도 '''이에모치'''(家茂)로 바꾸었다. 이에모치가 쇼군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혈통이었다. 그는 선대 쇼군 이에사다와 사촌 관계였지만, 경쟁자였던 요시노부는 쇼군 가문과의 혈연관계를 초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정도로 멀었기 때문이다.[18]
그러나 어린 나이에 쇼군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권력은 제한적이었다. 쇼군 취임 초기에는 이이 나오스케가 실권을 행사했으며, 분큐 2년(1862년)까지는 다야스 요시요리(田安慶頼)가[20][7], 그 이후에는 정치적 경쟁자였던 히토쓰바시 요시노부가[21][8] 쇼군후견직(将軍後見職)에 임명되어 이에모치의 권력을 견제했다.[18]
또한 쇼군 취임을 천황에게 보고하고 인정받는 의식인 쇼군 선하(宣下)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이전까지는 새로운 쇼군이 윗자리에 앉고 천황의 칙사(勅使)가 아랫자리에 앉는 것이 관례였으나, 당시 존왕(尊王) 사상이 강해지던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칙사가 윗자리, 쇼군이 아랫자리에 앉는 것으로 변경되었다.[18] 이는 막부의 권위가 이전 같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2. 3. 공무합체 정책과 가즈노미야와의 결혼
분큐 2년(1862년) 2월 11일, 막부와 조정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공무합체 정책의 일환으로, 고메이 천황의 여동생인 가즈노미야와 결혼하였다. 이는 정략결혼의 성격이 강했다. 가즈노미야는 본래 아리스가와노미야 다루히토 친왕과 약혼한 상태였으나, 막부의 요청으로 약혼을 파기하고 황족의 신분으로 신하인 쇼군에게 시집오는 강하(降嫁)를 하게 되었다.[9] 가즈노미야는 쇼군의 정실 부인을 뜻하는 미다이도코로(御台所)라는 칭호를 거부하고, 황족으로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미야'(宮) 칭호를 고수했다고 알려져 있다. 비록 정략적인 이유로 맺어진 결혼이었지만, 두 사람의 부부 관계는 매우 화목했다고 전해진다.2. 4. 교토 상경과 양이(攘夷) 약속
분큐 3년(1863년), 쇼군 도쿠가와 이에모치는 고메이 천황의 요청에 따라 교토로 상경했다. 이는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 이후 229년 만에 이루어진 쇼군의 상경이었다.[2] 로주(老中) 미즈노 다다마사(水野忠精) ・ 이타쿠라 가쓰시즈(板倉勝静), 와카토시요리(若年寄) 다누마 요시타카(田沼意尊) ・ 이나바 마사미(稲葉正巳) 등이 수행했으며, 총 3천 명의 대규모 인원이 동행했다.같은 해 3월 7일, 이에모치는 교토에 도착하여 입궐하고 자신의 의형(義兄)이기도 한 고메이 천황을 알현했다. 이 자리에서 이에모치는 천황에게 양이(攘夷) 실행을 약속했다. 또한 이때 천황에게 정무 위임의 칙명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사의를 밝혔는데, 이는 막연한 개념이었던 대정위임이 조정과 막부 관계에서 처음으로 공인되고 제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22][10]
이후 이에모치는 고메이 천황, 히토쓰바시 요시노부 등과 함께 가모 신사(賀茂神社)를 참배했다. 천황이 공식적으로 고쇼(御所)를 나선 것은 237년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천황과 함께 이와시미즈 하치만궁(石清水八幡宮)에 참배할 예정이었던 이에모치는 병을 핑계로 불참했다. 이는 겐지(源氏)와 연고가 깊은 하치만 신 앞에서 천황으로부터 직접 양이 실행의 칙명을 받는 것을 피하려 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쇼군의 대리인으로 참석했던 히토쓰바시 요시노부 역시 천황 앞에 불려갔으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자리를 피했다.
이러한 이에모치의 행동은 존황파 무사들의 강한 반발을 샀으며, 쇼군 살해를 예고하는 낙서까지 나타나는 등 정세는 더욱 불안해졌다. 실제로 육로로 에도로 돌아가던 요시노부 일행이 도중에 습격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조정은 이에모치의 에도 귀환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로주격(老中格)인 오가사와라 나가유키(小笠原長行)가 군함과 군세 1,400명을 이끌고 오사카(大坂)로 가서 조정을 압박해야 했다. 교토에 3개월간 머무른 이에모치는 도중의 안전을 고려하여 오사카에서 증기선을 타고 해로를 통해 에도로 돌아왔다.
2. 5. 효고 개항 문제와 쇼군직 사임 상신
게이오 원년(1865년), 세 번째 상락(上洛) 중 효고 개항을 결정한 로주 아베 마사토와 마쓰마에 타카히로가 조정에 의해 처벌받았다. 이에 이에모치는 쇼군직 사임을 조정에 상신하였고, 후계자로 히토쓰바시 요시노부를 추천하며 동쪽으로 돌아갈 뜻을 내비쳤다. 고메이 천황은 이에 크게 놀라 이에모치의 사임을 만류하고 철회시켰으며, 이후 막부 인사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러한 행동의 배경에는 대정위임을 재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조정과 사쓰마 등 여러 번(藩) 세력에 의한 제약, 그리고 조정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시노부에 대한 불신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2. 6. 제2차 조슈 정벌과 사망
게이오(慶応) 2년(1866년), 금 부채 모양의 우마지루시(馬印)를 내걸고 대군을 이끌고 상경하여 제2차 조슈 정벌(第二次長州征討)에 나섰으나, 오사카성에서 병으로 쓰러졌다. 이 소식을 들은 고메이 천황은 궁중 의약 담당 기관인 전약료(典薬寮) 의사 다카시나 쓰네요시(高階経由)와 후쿠이 노보루(福井登) 두 사람을 오사카로 보내 치료하게 하였다.[10] 에도성에서는 덴쇼인(天璋院)과 가즈노미야의 주치의(侍医)로서 에도 성 잔류 책임자(留守)였던 다이젠노스케 고겐인(大膳亮弘玄院), 다키 요슌인(多紀養春院, 다키 안타쿠多紀安琢), 도다 죠안(遠田澄庵), 다카시마 유안(高島祐庵), 아사다 소하쿠(浅田宗伯) 등이 오사카로 급파되었다.[10]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7월 20일 쇼군 이에모치는 오사카 성에서 사망하였다. 사인은 각기병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알려져 있으며[10], 향년 21세(만 20세)였다. 이에모치의 유해는 영국에서 8월에 구입한 기함(旗艦) 죠게이마루(長鯨丸)에 실려 9월 2일 오사카를 출발, 6일 에도에 도착하였다.[10] 사후 정1위(正一位) 태정대신(太政大臣)으로 추증되었다.
이에모치는 임종 직전 도쿠가와 종가의 후계자이자 차기 쇼군으로 다야스 가메노스케(田安亀之助, 다야스 요시요리의 아들로 훗날 도쿠가와 종가 제16대 당주 도쿠가와 이에사토가 됨)를 지명하는 유언을 남겼다.[10] 하지만 당시 다야스 가메노스케는 겨우 3세(또는 4세[10])에 불과했고, 조슈 정벌 등 국정 현안이 산적한 시기였기에 가즈노미야와 유력 번(雄藩)의 다이묘 등이 반대하여[10] 후계 지명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결국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제15대 쇼군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쇼군 요시노부는 이에모치가 양자로 삼았던 다야스 가메노스케를 다시 자신의 양자로 입적하였다. 이에모치 사후, 부인 가즈노미야는 세이칸인노미야(静寛院宮)로 개명하였다.
3. 연표
(음력)
겐지 원년